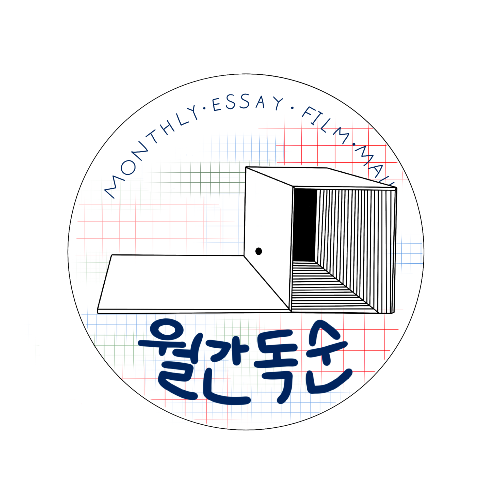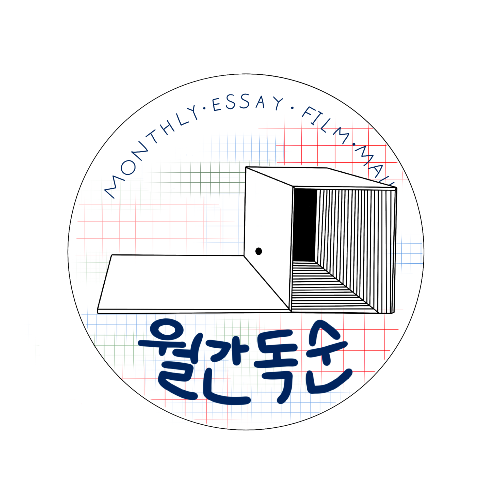누군가를 이해하면, 용서는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용서하려면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누군가를 용서해본 적이 있나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처가 나아서 다 괜찮아지면 그때의 그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용서인걸까요? 바른 용서를 구하는 법과 바르게 용서하는 법. 그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박하사탕>은 저에게 용서에 관한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 중 하나에요. 너무 유명한 이 영화를 다들 보셨지 않을까 싶어 영화 소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 하게 되긴 합니다만 저는 김영호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해가 돼서 복잡한 마음을 갖게되는 영화입니다.
1999년 봄, 마흔 살 영호는 '가리봉 봉우회' 야유회에 허름한 행색으로 나타난다. 그곳은 20년 전 첫사랑 순임과 소풍을 왔던 곳. 직업도 가족도 모두 잃고, 삶의 막장에 다다른 영호는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한다. 영호의 절규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흘 전 봄, 94년 여름, 87년 봄, 84년 가을, 80년 5월 그리고 마지막 79년 가을. 마침내, 영호는 스무 살 첫사랑 순임을 만난다.
영화 소개글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줄거리가 스포일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간들을 보고 있으면 김영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언제 부서졌는지. 망가지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인지 선명하게 영화 속에서 보이거든요.
물론 모두가 김영호처럼 살지도 않거니와, 김영호의 삶을 대변해주지도 않아요. 김영호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끝까지 비겁해서 목숨마저 제 손으로 끊지 못해요. 나 어떡해… 를 외치고 싶으면서도 차마 그 입으로는 그 말을 내뱉지도 못해서 노래로 대신 변명을 내뱉어요. 나 어떡해, 나는 어떻게 하냐, 가지 말아라. 그런 가사들이나 내뱉다가 그냥 그렇게 기차에 치이는 거예요. 남탓만 하던 찌질하고 비겁한 사내다운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테잎이 돌아가듯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 정말 이상하죠. 스크린 앞에 앉은 나는 그냥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조차도 어려지는 것처럼, 김영호라도 된 양 그렇게 변하게 돼요. 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그냥 너무 아픈데, 이 슬픔이 아주 약한 물주머니에 담긴 것처럼 느껴져서 톡 찌르면 눈물이 줄줄 날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허탈하게 영화를 보게 돼요.
한 놈은 죽이고 간다는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도 결국 아무도 해치지 못한 권총같은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 권총을 장난스럽게 머리에 대보는 건 또 왜 그렇게 슬플까요?
내 말 들어봐. 나 이 총으로… 딱 한 놈만 죽일라 그랬어. 나 혼자 죽기엔 너무, 너무 억울하니까 딱 한 놈만 내 저승길에 같이 동행하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놈들 중에 딱 한놈. 그런데 어떤 놈을 죽일까? 참 고민 되더라고. 응? 딱 한놈을 고를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피 같은 내 돈 다 날려버리고 깡통차게 한 증권회사 직원놈을 죽일까? (…)
그런데 죽일 놈이 없더라고. 내 인생을 요 모양 요꼴로 만든 죽일 놈들이 너무 많아서 한놈을 못 고르겠더라고. 그래서…
당신, 어느 놈이 보내서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날 잘못 택했어.
어떻게 할래? 구경하고 갈래? 그냥 갈래?
권총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김영호가 하는 말이 이래요. 사실 근데 억울하면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많아서 못 고르겠더라. 그래서 혼자 죽기로 결심했다는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순간 자기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간 곳에서 만나는 게 순임입니다. 순임과 만나는 공간에서의 영호는 참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 것처럼 굴어요. 어제까지는 총을 들고 있었으면서, 죽으려고 했으면서. 순임을 만나면서는 그 옛날에 받았던 박하사탕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는 나쁜 말을 하고, 오늘은 용서를 구하고. 오늘은 후회하기도 하고, 오늘은 새 출발을 하기도 하고.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결국 어제의 선택도, 오늘의 선택도 내가 했다는 지점에서 일맥상통한 지점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본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안타까워서요. 사과하는 법도 모르고 사과해야 한다는 사실도 못하는 이 사내는 뽀삐가 보고 싶어서 집에 왔다는 구질한 변명이나 해대요. 사실은 세민이가, 혹은 아내가. 사실은 온기가 그리웠을텐데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김영호는 나아가서 그 세대로 저에게는 남거든요. 상흔을 가진 세대들. 물론 상흔을 얻을만한 일이 너무 촘촘하고 많이 배치된 것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 김영호를 이해하면 전세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그냥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조금은 편안해지고…
이 영화에서 김영호를 연기한 배우 설경구는 김영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gv에서 받고는 이 한 마디를 해요. ‘거기선 잘 있습니까?’ 라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김영호는 잘 있으면 안 되는 사내입니다. 누군가를 해쳤고, 자기 자신도 해치고. 주변까지 계속 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선. 그 위에선 그래도 잘 있을까 싶게 되는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했던 그 남자의 평온을 내가 왜 빌어주고 있나 싶어서요.
설경구 배우는 이 영화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문소리 배우 역시 그렇다고 하고요, 처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시나리오를 먼저 읽었는데 영화를 못 보겠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지 싶었거든요.
2시간 동안 김영호의 인생에 대한 변명을 이 영화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엿 같으면서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생 과거에 살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영상으로 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이 이 사람이 불쌍할 것 같았거든요. 용서 받아선 안 될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제는 친구와 술을 간만에 꽤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끔은 과거에 이룬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만 생각하냐고.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엄격하고 가혹하게 구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히 가혹하게 굴지 않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을 하는 것 같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방법이 분명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게 아쉬운거죠. 인생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씁쓸하게 곱씹게 되는 그 반복이 자꾸만 후회하게 하고, 입맛을 쓰게 합니다. 아, 내가 어떤 시간에 갇혀있는 것처럼 김영호도 똑같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평생을 망가진 채로 사는구나. 비겁한 사람인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김영호에게서 저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나봐요.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아주 시 같거든요
그는 자기 기분에 취해 악을 쓰듯 노래 부른다. 거기에다 잔뜩 멋부린 제스츄어까지 곁들인다. 그의 모습은 아무래도 도가 지나친 듯 보인다. 마치 태엽이 너무 감겨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파열 직전의 자동 인형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서술법은 시나리오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보통은 ‘김영호, 악을 쓰듯 노래한다. (노래가사) 멋부린 제스츄어도 곁들인다. 도가 지나친 모습.’ 정도로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이런 서술은 사실 이 시나리오에서 꽤 잦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술들을 읽으면 다시 한 번 김영호에게 사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느끼게 됩니다. 사회는 김영호를 게속해서 절벽으로 밀고, 밀리고 밀린 김영호는 결국 자살같은 타살을 마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김영호의 죽음은 타살이겠구나. 영화를 두 번째로 봤을 때였나. 그 때 엄청 울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사람은 편하게 죽지도 못했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조차 없어서 결국 자살도 남의 손을 빌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 시간을 뚫고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그 시간을 드디어 처음으로 보는 순간, 그 기차에 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때의 촬영이 아주 위험하게 진행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장면이 예전과 동일하게 느껴지진 않지만요.)
-
예전에 썼던 <러덜리스> 편지가 생각이 나요.
‘그(딜런)는 자신이 밴드로 공연을 하던 펍에서 아무런 덧붙임 없이 ‘내 아들의 이름은 조쉬 매닝이었습니다. 그는 2년 전 6명의 아이들을 총으로 쐈죠. 이건 제 아들의 노래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노래는 sing along 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갇혀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내 말은 다 거짓이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고. 숨을 들이쉬고 별을 세고, 10까지 세어 보라고. 어딘가에서 이 노랠 듣고 있다면 같이 불러달라고. 어쩌면 사랑이 답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 할 뿐이라고, 모든 것에. 불이 켜지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송두리째 변할 것이라고. 그래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어 본다고. 어디선가 내 노래를 듣고 있다면 같이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될 수 있고 떠난 것도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네가 여기서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하는 가사 끝에서 샘은 my son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나요. 그 뒤의 샘의 인생도, 앤의 인생도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샘이 자기만의 애도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수 클리보드 역시, 결국 자신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단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가해자 옹호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거든요. 쿠엔틴을 바라보는 샘의 시선은 사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조쉬를 떠올리기 때문임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영화를 다시 볼 때는 오프닝부터 그냥 눈물이 줄줄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영화를 볼 때마다 더 울고 있는데, 이 감정을 아직까지 어떻게 언어로 옮겨야 할 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어떤 의미로 사랑하게 된, 그리고 주인공이 안타까워진 영화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은 뭘까.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공감하기 때문일까. 이 사람을 안타까워해도 될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이 주인공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한 것은, 마음 한 켠에서 가해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살면서 마주한 그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되어서 조금은 용서하게 되는데 그 순간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을. 내가? 하게 돼서요. 물론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회복될 수 있어
떠난 것도 잊혀지지 않아’
<러덜리스> 속에 나오는 Sing Along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노래의 믿음은 아름답고도 슬퍼요. 회복될 수 있지만 잊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박하사탕>을 보고 슬픈 건 맞는데 그 슬픔의 이유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또다시 돌고 돌아서 내가 이게 슬픈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변명을 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편지를 쓰면서 윤도현밴드의 박하사탕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고통의 시간만 보낸 후에는 텅 빈 하늘만 아름다웠다고. 그 하늘마저 희미해지고 내 갈 곳은 다시 못 올 그 곳 뿐이라는 가사가 너무 슬프죠. 남아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그 시간들도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싶다는 가사를 천천히 곱씹다보면 이 노래의 끝은 그냥 돌아가고 싶다는 것으로 끝나요. 무슨 대단한 꿈도 아니죠.
그리고 그 끝은 영화에서도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가가 되고 싶다고. 그런 꿈을 이야기해요. 영호씨 꿈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순임의 말과 함께요. 이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순간을 기차를 바라보면서 생각했구나. 이 장면이 다시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무거우면서 슬퍼집니다.
이번 편지를 쓰면서 슬펐던 영화는 그냥 온전히 슬프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슬플 수도 있고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려고요. 계속 감정의 이유를 찾다보면 결국 김영호와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그 시간대에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법은 여전히 모르겠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김영호는 그만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갇혀서 살지 않길. 이제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영화같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