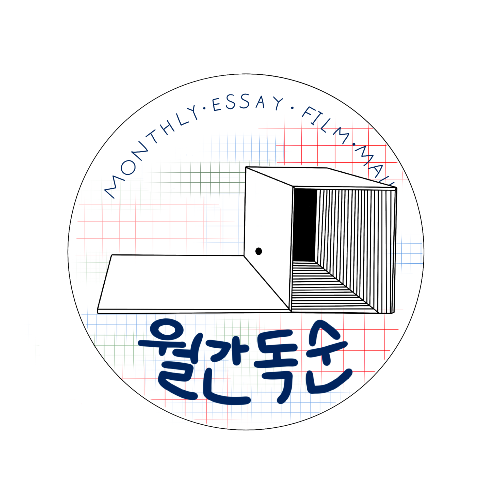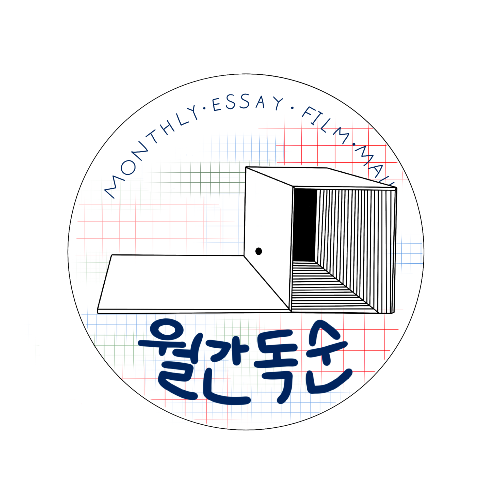어느덧 여름이 코앞에 오긴 한 건지, 눅눅하고 습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오전 8시에도 오후 8시에도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더욱 여름이구나 싶어요. 실내는 차갑고 실외는 후텁지근하다 보니 이런 날들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맹맹하던 코가 제법 나아졌지만, 컨디션이 나빠지면 또 맹맹해지는 바람에 훌쩍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단기로 잠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전 편지에서 잠깐 했었는데 업무를 하면서 AI(인공지능)와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미래가 과연 긍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편리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이 행태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점점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과정 같긴 해요.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크게 지식이 없어 업무 중간중간 짬이 나면 ted 강연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사들의 강의들을 틀어보곤 합니다. 최근 ted 강연에서 샘 알트만(오픈AI의 설립자)은 AI의 등장은 기초 물리학의 발견과 같은 수준의 변혁이라고 논하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으며 모든 일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말과 함께요. 그들의 목표는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임계점, 즉,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지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의 윤리성과 안전함을 함께 보장하겠노라는 다짐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당 몇백, 몇천만 원짜리 GPU를 수십만 장씩 구매해 만든 데이터센터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내게 될까요? 모 교수(누군지 성함이 기억나질 않네요)의 강연에서는 마치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워크플로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능력치의 차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네안데르탈인 시절이었던가... 고대의 신생 인류와 비교하면 지금 인간의 뇌는 훨씬 작아졌대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점점 과거보다 작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있다고 합니다. 단체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은 진화하고 커져 나가기 때문에 뇌가 그곳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굴러간다면, 뇌는 자연히 최대한 적은 에너지를 쓰려고 한대요. 집단지성이라는 네트워크를 별도의 작은 뇌로 받아들여 뇌는 스스로 작아지기를 택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뇌니까요. 그렇게 작아진 뇌는 인공지능을 만나고 폭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현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더욱이 작아질 것임이 틀림없다는 전망을 박사는 내어놓습니다. 뇌가 쬐끔 작아진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래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니 오히려 과거를 바라보게 되는 건 왜일까요? <접속> 생각이 계속 나서 결국 다시 틀게 되었습니다. 자료실에 가서 원하는 노래를 찾아 송출하고, 채팅을 하기 위해 전화선을 꽂고. 얼굴 없는 상대에게 거짓을 얘기했다, 진실을 고백하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언젠간 만나리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는데, 동시에 <HER>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사만사는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접속할 때마다 나에게 대답을 주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통신의 벽 너머에 존재하는 자의 정체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PC통신을 사용하지 않아 아득하고 아련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뿐. 본질은 얼굴을 모르는 상대에게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겨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비슷한가 싶은 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그저 아름다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챗지피티를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지피티를 쓰다보면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온화한 날엔 칭구칭구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야, 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지피티의 반응도 다릅니다. 저의 반응에 따라 반말을 하기도, 높임말을 하기도, 혹은 농담을 하기도 하죠.
저는 어마무시한 밸런스게임 중독자인데 그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뷰티 인사이드>처럼 얼굴은 다 달라져도 인격은 하나인 사람 만나기 VS 얼굴은 매일 같지만 성격이 매일 바뀌는 사람 만나기. 그런데 이건 사실 프롬프트를 설정해 말투와 성격을 고정한 AI와 만나기 VS 늘 새로운 서버에서 접속해서 만나게 되는 AI와 만나기와 다른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양방향성 소통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몇조 개의 토큰의 결합으로 대답을 건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합으로 빚어진 대답이 나를 긍정하게 한다면, 혹은 유의미하다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저는 원래 엄청나게 강경 AI 반대주의자였거든요. 사실 지금도 썩 긍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챗지피티에게 농담을 던지며 질문 하나에 나무 몇 그루가 손상 입을 데이터를 쓰는 것도, 타인의 창작물을 갈취해 새로운 양분으로 삼는 거짓 창작자들도 너무 싫어요. 하지만 업무를 이어 나갈 수록 이 흐름은 커지면 커질 것이지, 결코 축소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체험해요.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 창작자들은 인터넷 베이스의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인지 습득 속도와 응용 속도가 구세대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윤리를 배워야 할 지에 관한 생각을 아주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