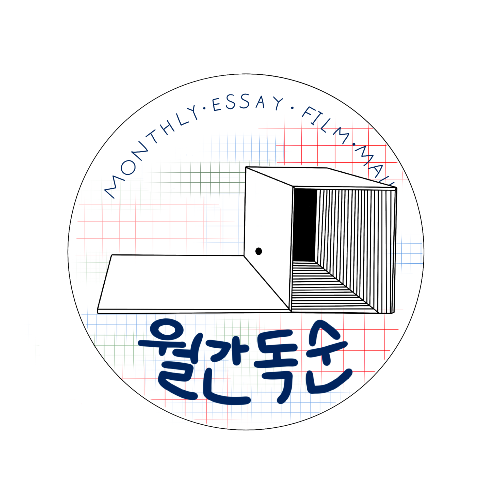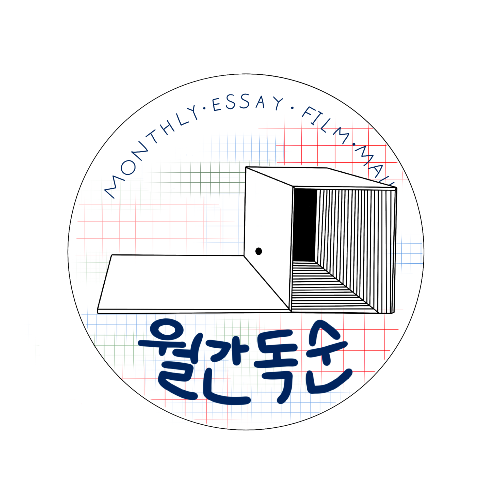영화의 마지막에서 드디어 글린다는 그리머리를 읽게 돼요. 상실이라는 감정을 겪어본 적 없던 삶을 살던 글린다가 자신의 반쪽들을 모두 잃고나서 자신의 위선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머리가 스스로를 드러낸 거죠. 물론 저는 글린다가 과연 피예로를 정말 사랑했을지, 엘파바를 온전히 이해했을지에는 회의감이 들지만… 어찌 되었든 본인의 최선을 다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글린다가 택한 단어에 드러나요.
본인을 선함으로 칭하지 않고, 선한 마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요. 그 말은 살점을 드러낸 적 없는 한 여인이 스스로의 약점과 치부를 모두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자신이 선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 역시 노력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선함(good)이라는 건 명사가 아닌 거죠. 머물러있는 단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해야 하는 동사인 거죠. 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저 명사로만 존재할 때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오즈민을 이야기할 때, 모든 오즈민들을 얘기하며 동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택한 그녀에게 시스테리를 비롯한 원새(원숭이+새)들도 마음을 줍니다. 엘파바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글린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1막 첫 곡 no one mourns the wicked는 아무도 마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no, one mourns the wicked 한 사람만은 마녀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굿을 다 보고 나면 우리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1막을 여는 인물이 그녀의 죽음을 함께 겪은, 모든 걸 알게 된 글린다라는 걸 알게 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친구를 향해 말을 타고 뛰어갈 때. 모든 끝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할 때. 버블 속에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의 뻐꾸기로 살지 않고, 버블을 터뜨리고 나와 말하기를 택할 때. 나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약해질지언정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게 글린다가 택한 속죄이자 사랑의 방식일 거예요.
동시에 엘파바는 글린다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선인을 위해 본인이 악인으로 남기를 자처하겠다고 말해요. 악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본인이 악하게 남겠다는 그 결심이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버블을 터뜨린 친구에게 악인으로 남으며 그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택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택하니까요. (피예로는? 사실 저에게 너무 흐린 기억으로 남는지라… 엘파바 잘 챙겨주시고… 정도의 감상입니다.)
두 사람 중에 나는 누굴 닮았나 고민해보면 둘 모두를 조금씩 닮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개연이 부족하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후기도 많은데… 아마 원작 뮤지컬의 전개가 너무 급작스러워 어쩔 수 없이 영화에도 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 두 여인이 각자가 원하던 방식의 선함을 발휘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벅벅 문지르며 극장에서 나와 바로 편지를 써보았어요.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