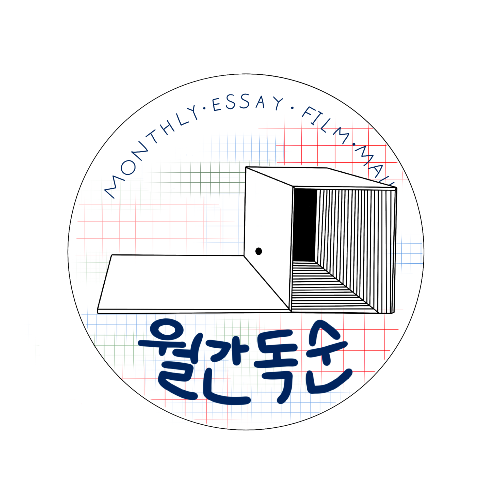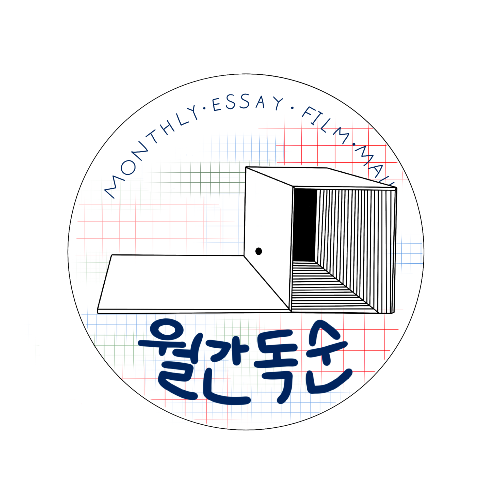긴 연휴의 끝이 다가오는 밤에 편지를 쓰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다들 어떤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가능한 연휴에는 본가에 갔다 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 저는 올 연휴에도 내려갔다 왔는데요, 긴긴 연휴 내내 전기장판 아래서 움직이지도 않다 왔습니다.
이번 설은 저희 집에도 꽤 큰 사건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드디어 차례를 생략하게 되었거든요. 친척들과는 왕래를 끊었지만 그래도 기제사, 차례는 꾸준히 지내왔었는데, 지난 추석 차례를 생략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다같이 전도 부치고, 소박한 한상차림을 꾸리곤 했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관습처럼, 그저 어떤 날에는 어떤 것을 해야만하는 의무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건 사실 꽤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관습이라는 것을 무시하기엔 어렸던 저는 그 관습을 충실히 이행하곤 했죠.
친가에서 아빠가 막내여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전과 튀김은 저희 집의 몫이었는데, 그 덕에 어릴 때부터 제사와 명절이 다가올 때면 고소한 기름냄새와 함께 했습니다. 뽈뽈거리며 엄마 옆에 앉아 전을 주워먹던 기억, 밀가루는 내가 뭍여보겠다며 나서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다소 좋게 희석되어 남기는 했으나 좋은 몇 가지의 추억으로 덮기엔 아찔한… 경상도의 추억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는 되물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저의 친가에서는 남자 상과 여자 상이 나뉘어져있었어요. 며느리들의 자리는 부엌이었죠. 제사를 지내고 철상(제사 상을 치우는 것)하면 제기에 올렸던 전들을 모두 부엌으로 날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쏟으면 안된다는 어른들의 잔소리에 옮기는 내내 집중하던 기억이 납니다.
철상과 동시에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거실 창 옆에 술상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시금치, 무나물, 콩나물은 매해 빠지지 않는 나물이니 나물을 작은 종지에 얹고, 생율과 뾰족뾰족 톱니 모양을 내 자른 삶은 계란을 한 접시에, 그리고 종류별 전을 담은 접시. 그리고 술. 그걸 작은 반상에 올려서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걸리, 소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멋들어진 술상이죠. 상상만해도 군침이 싹 도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이라 그 술상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아마 연을 계속 이어갔더라도 성인인 저 역시 그 상에 자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술상에는 남성 어른들이 자리하고 본격적인 점심을 먹기 전 술자리는 시작되곤 했어요. 중간중간 훈화 말씀도 들으며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왔다갔다하면서도 그때는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의 경험이란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새삼 생각됩니다.
여튼 그들의 술자리가 벌어지는 동안 부엌에선 제기를 씻고, 닦고, 점심상을 차릴 준비를 했어요. 큰 상을 두 개 펴고, 집안 가장 어른이 할머니셨는데 할머니 자리에 방석을 두고, 옮겼던 전을 다시 예쁘게 담고… 집안 어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비빔밥 파와 일반 밥 파를 나누어 수량 조사를 하고. 막내였던 저의 몫은 비빔밥 몇 명, 맨밥 몇 명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량을 전달하고 나면 다시 접시에 옮겨담은 전과 튀김, 산적과 생선, 나물과 반찬들을 큰 상으로 옮겨야 했어요. 큰 상은 어른들 상, 작은 상은 아이들 상이었죠. 어른 상에 자리할 수 있는 여성은 고모 뿐이었어요. 고모는 할머니의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상은 다행히 차별이 없는 상이었는지 남아와 여아 모두가 자리할 수 있었답니다. (^^…) 하지만 당연히 이곳엔 친가의 피를 타고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다른 성씨를 가진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을 갈라먹었답니다. 어렸던 저는 그 경계를 잘 이해할 수 없어 (지금도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 부엌과 거실을 왔다갔다하며 다른 성씨의 그녀들과 함께 큰 상에서 밥을 먹고 싶어했지만 그걸 이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그 부엌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는 걸 은연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음식을 해오고, 넘어오고 나서도 끝없이 부엌에 갇혀있던 그들은 끝까지 부엌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