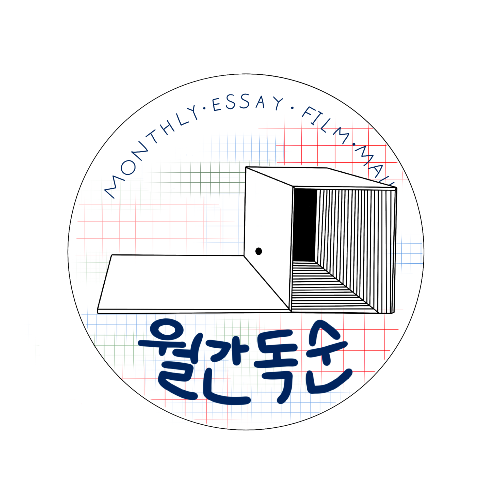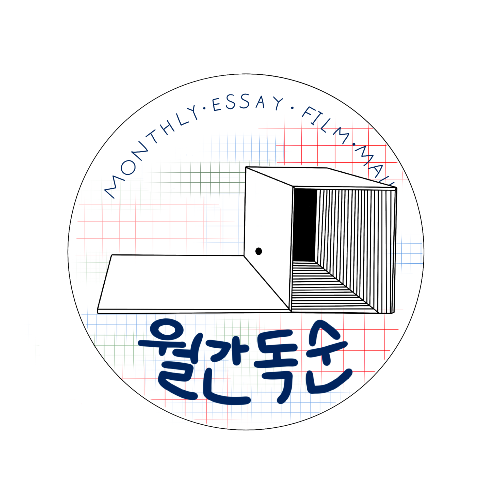연말입니다. 심란한 한 해가 끝나가지만, 새로운 해로 새로 나아갈 수 있으리란 다짐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모두 지웠어요. 어제 아침 눈뜨자마자 제주항공의 참사 기사를 접했거든요.
지난 편지에도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라우마는 그런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일을 접한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 트라우마가 축적되는 기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떤 마침표도 찍지 못했는데 자꾸만 새로운 슬픔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게 밉고 싫어집니다. 모르는 남이 아니라, 한 두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들의 눈물과 오열이 절대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에는 정확히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즐거운 연말이 보여요. 파티, 케이크, 술자리, 왁자지껄한 연말. 그리고 뉴스를 틀면 이별, 삶, 죽음 같은 것들이 가득하죠.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냐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저에게 좋은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굉장한 이질감을 주는 요즘입니다.
슬픔에 매몰되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할 줄 아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본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영화를 절대 집에서 혼자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지 못해 분명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결국 다음에, 다음에… 하며 영화를 끄게 될 것임을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보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겠는 영화들이요. 내가 누리는 평화와 평온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느끼게 하는 영화들이요.
저에게는 <사마에게>(와드 알 카팁) 같은 영화들이 그러합니다. 당시 저의 방에는 흔들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담요를 하나 덮고 앉아 영화를 보는 게 저의 낙이자 일상이었어요. 당시 친구랑 하던 스터디 때문에 <사마에게>를 봤어야 했는데 코 앞 화면 속의 생생한 폭력이 사실은 나의 현실과 얼마나 멀게 있는지 느끼는 순간 드는 죄책감과 괴리감 같은 것들이 휘몰아쳤죠. 이렇게 평화롭게, 따뜻하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마주 볼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 비하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사실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폭력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너무너무 두려운 영화였어요. 극장을 안전하게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공포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혼처럼 떠도는 사운드가 주는 공포. 잊지 않고 흐르는 것들에 고함. 떠내려오는 재들과 떠도는 연기. 이상하리만치 비옥한 토양.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4.3 생존자의 증언.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들. 파괴된 줄도 모르고 부서진 자들. 어느 순간 치밀어오르는 토기. 눈을 막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들. 생명, 죽음, 파괴 그리고 존엄. 보는 내내 한강을 생각했다. 부서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나 짓밟힌 것들. 그리고 스베틀라냐 아락세이야비치.
어째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종자를 이유로 무시하고 살해하게 되는 걸까? 최소한의 동력으로 최대한의 살해를 꿈꾸는. 그런 것들이 어째서 가능할까. 평화가 얼마나 역겨운지.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출처는 어디인지. 죽음, 노동,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