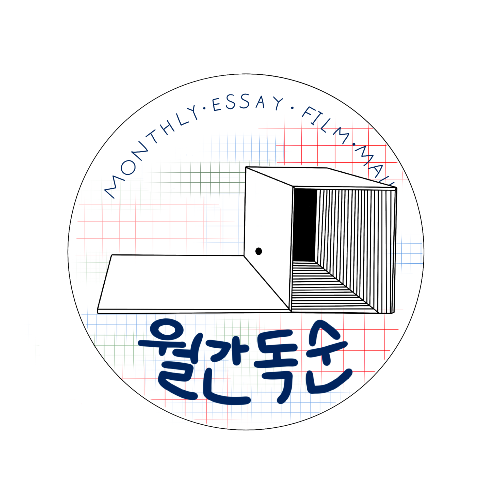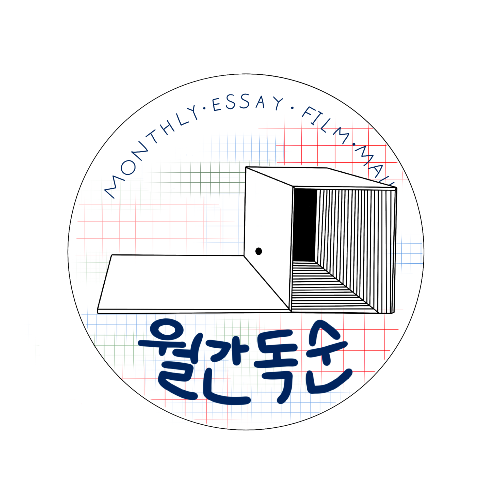시절이 수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하루도 푹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불안감에 밖에서 사이렌만 울려도 벌떡벌떡 깨고 새벽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 어스름하게 하늘빛이 바뀔 때야 선잠에 듭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선하며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구하고, 손 내밀며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요. 어떤 때에는 시절이라는 한계로, 이념이라는 것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도 했겠으나 결국은 바른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모두 비극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공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삶에 희망을 준다는 믿음은 3일을 기점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가야 할까’하는 고민과 두려움에 몸이 굳는 경험을 했어요. 언제 저 총부리에서 총성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시간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아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십수 번을 읽었는데 그 문장문장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이제껏 본 각종 근현대의 폭력을 다룬 이야기와 필름 조각들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라우마인 거죠.
우리 세대에게는 많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세월호를 실시간으로 경험했고, 이태원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계엄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집단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력하게 사라질 때의 공포를 결코 모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속에서 그 무력함을 더 처절히 느낀 세대이기도 하죠.
실시간으로 또다른 희생을 목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저에겐 그 두려움이 그게 가장 컸습니다.
전 엄태화 감독의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산에 놀러 갔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알을 만난 소년들이 이를 깨게 되고 시간에 갇히는 이야기예요. 멈춰진 시간 속의 아이들은 나이를 먹지만, 현실의 멈춘 사람들에겐 그 순간이 찰나로 지나갑니다. 나만 늙어버렸지만, 나 역시 갇혀있는 거죠. <가려진 시간>은 사실 ‘갇혀진 시간’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에게는 이 '갇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넘어선 것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이 되기도 하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그곳에 돌아가 있는 아득한 심정. 빠져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2018년으로 끝없이 회귀하곤 하는데요, 그땐 바로 영화계 내 미투라고 하는 고발이 끝없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의 학교 역시 성추행범 교수가 있었고 그를 학교에서 내쫓기 위한 비대위 활동을 했었어요. 정의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20대 초반으로 어렸고, 뭘 정말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털어낼 수 있을 일에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죠. 점점 외곽으로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며 조금씩 외로워지기도 했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느라 며칠씩 밤을 새우면서 단어들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의도적으로 여성 의제를 무시해 보기도, 때론 누구보다 열심히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의제를 놓을 수 없단 걸 받아들이고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며 조금 더 성숙하게 세상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느 순간엔 다시 그때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나도 모르게 갇힐 때 옆의 친구들이 저를 끄집어냅니다. 그 친구들의 손을 잡아 시간에서 빠져나온 저는 다시 고민합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나를 갇히게 하는 순간들(혹자는 투쟁의 시간이라고 부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를요. 이 고민을 수백, 수천 번을 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돌아간다’는 선택지 외에는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세상이 쬐~~~끔은 나았으면 좋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성하는 건 역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려진 시간> 속 ‘성민’의 세상은 시간 속으로 갇힌 후 사라져요. 같은 동네를 돌고 돌면서 끝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유일하게 알 ‘수린’을 그리워하죠. 시간 속에 빠진 다른 친구들은 좌절하고 떠나지만, 성민은 끝없이 믿어요. 수린은 이 모든 일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다시 흐른 순간. 훌쩍 나이를 먹어버린 성민은 이 세상에 결코 발 들일 수 없는 외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무슨 수를 써도 다시 이 세상과 융화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수린은 있습니다. 늙어버린 자신에게도 거리낌 없이 ‘성민아’라고 부르는 수린이요.
수린에게 위기가 닥치자, 성민은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다시 십수 년을 시간에 갇힌다면 수린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없는 외로움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죽음보다 짙은 고독의 무게가 성민을 짓누르지만, 성민은 결국 세상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이번엔 스스로 시간 속에 갇히길 택합니다. 자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세상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세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시간으로 또 다른 희생을 목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에겐 이 두려움이 모두 있지만, 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세계와 자유를 누군가의 마음대로 유린하게 둘 수 없다는 분노와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 역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한강 작가의 말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렇게 시위를 다녀왔습니다. 공연과 콘서트 짬 덕분인지 마지막엔 꽤나 앞까지 나아가 외치고 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진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로 힘을 내게 됩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수백만 사이에 있는 기분은 역시 든든하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