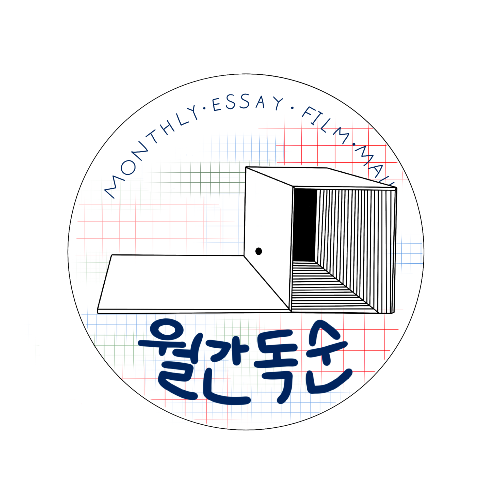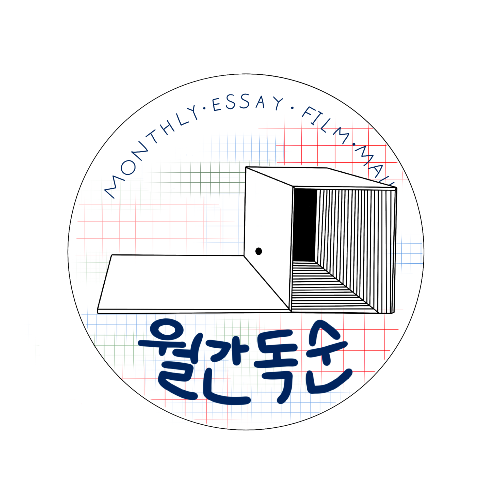요 며칠 간은 드라마 <괴물>을 다시 봤어요. 신하균, 여진구 주연의 드라마로 최근 몇 년 간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니다. 시놉은 '누가 괴물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 만양에서 펼쳐지는 괴물 같은 두 남자의 심리 추적 스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시놉으로만 설명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주인공 이동식은 과거, 자신의 여동생과 동네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아요. 하지만 증언과 여러가지 미비한 사건 정보로 인해 풀려납니다. 하지만 만양 사람들은 여전히 이동식을 의심해요. 아버지는 동식의 쌍둥이 여동생 유연을 계속 기다리다 동사하고, 어머니는 그 후로 반쯤 정신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방황하던 동식은 더 억울하고 싶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경찰이 됩니다. 광역수사대에 있다 사고를 친 좌천 격으로 동식은 다시 만양으로 돌아오고 그 도시에 한주원이라는 경위가 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해요.
가타부타 이야기를 생략하고 얘기하자면.. 이동식은 착한 놈이었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고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같던 동생 민정이 사망했음을 짐작한 그는 민정의 훼손된 손가락을 평상에 올려놓기로 택합니다. 민정을 찾고 싶지만 민정을 찾을 수 없다는 마음 속 확신이 든 동식의 선택은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거죠. 사체를 찾을 수 없다면, 살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벌할 수 없으니 시신의 일부로 사건을 '사건화'하기로 마음 먹은거죠.
이렇게 시작된 사건을 따라가다보면 모두가 괴물처럼 느껴져요. 괴물을 미워하기도, 괴물을 부러워하기도. 괴물이 되지 않기를 택한 괴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 드라마를 자주 생각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극 중 이런 대사들 때문이에요. 본인의 동생 지훈의 거짓말을 알게 된 지화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괴물> 6화 중)
미안하다, 동식아. 나 알고 있었어. 지훈이가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못했어. (..) 나는 끝까지 너한테 숨기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나보다 낫네. (...)
알아, 웃기지? 30년 넘도록 알고 지낸 친구놈 못 믿는 내가. 나도 웃겨. 근데 더 끔찍한건 뭔지 알아? 지훈이가 거짓말 한 거면 어떡해?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걔가 그런 걸수도 있잖아. 너는 걔를 믿는구나. 나보다 낫네. 다 나보다 나아.
나도 내 동생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나 정말 내 동생 아니라.. 정제였으면 좋겠어. 박정제가 한 짓이면 좋겠어, 박정제가 범인이면 좋겠어. 나 너무 괴물 같지, 그렇지, 제이야.
그리고 이런 대사도 나와요. 역시 지화의 대사입니다.
(<괴물> 16화 중)
뭐니? 이동식, 말해. 뭐야.
'넘어오지 마'? 민정이 손가락, 네가 가져다 놨지? (스포일러) 내가 왜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해?
야, 너. 너야말로 미안하다는 개소리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
나 단 한 번도 네 앞 막은 적 없어. (스포) 가족은 너니까, 피해당사자는 너니까. 너 하는대로 다 따랐잖아. 근데. 이제와서 '넘오오지마'? 너 계속 이럴거야? (스포) 뭐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대체. (...)
이 대사들에 묻어있는 감정은 선연한 분노, 질투, 미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입밖으로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내뱉지 않는 대사를 지화는 내뱉어요. 스스로가 괴물 같아진다고, 스스로를 괴물이라 칭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미운 자신을 대면해요. 그래서 오지화는 괴물이 될 수 없어요.
취준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저 역시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에 볼멘소리가 나오려다 꾸욱 참을 때. 주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친구를 질투하기도. 모두의 삶은 각자의 힘듦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삶은 시원시원 풀리는 것 같아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좋다 싶으면서도 왜 그들만 잘 되는지. 누군가의 불행을 나는 원하는 건지.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너무 괴물같다고 생각할 때 오지화의 대사가 귀에 꽂혔어요.
괴물 같다는 말을 스스로 입 밖에 내뱉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저 대사를 듣다 저도 모르게 따라 중얼거렸어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덧붙인 대사는 지화의 분노가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선을 넘은 자들의 행동들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 싫음 아래에는 그게 옳다거나, 그래야 한다거나, 나도 그러고 싶다거나 하는 은근한 질투 같은 마음이 깔려서인지. 지화는 본인의 삶에선 언제나 선을 넘고 있는데 선을 넘지 말라는 말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요. 본인은 뭐가 잘났다고. 본인만 넘을 수 있는 게 선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질투라는 단어를 가만히 곱씹어보면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이 떠오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이겠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앞의 문장에 눈이 갑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문장이요. 취준이라는 어떤 터널 속을 지나오면서 저의 희망의 내용 역시 질투 뿐이었던 걸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인정해봅니다.
사실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계속 구직란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음침하게 속으로 미워하기보다 그 질투를 털어놓고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저의 고해성사 같은 편지가 되었네요. 핫핫.
다들 스스로가 괴물 같을 때가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