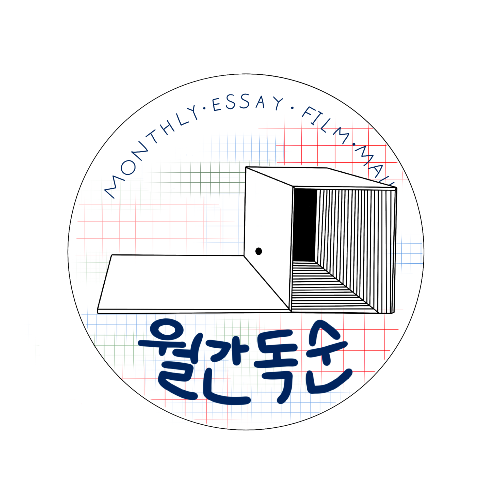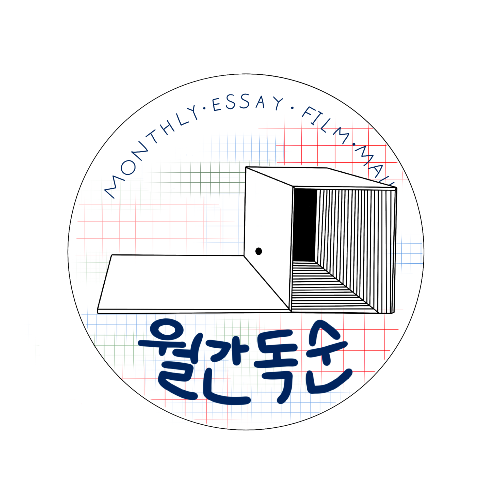이 편지를 쓰려고 사진첩을 거슬러 올라가다 발견한 건데 전시의 제목이 <A One &Two Edward Yang Retrospective>였네요. 한화로 2천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들어온 전시장은 에드워드 양의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당시에 장편 드라마 하나를 끝내고 출국한 상태라 영화에 대한 사랑이나 갈망 같은 건 많이 흐릿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90년대 촬영을 위한 스토리보드, 콘티, 스크립트 등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간 주구장창 자동차 번호판을 덧방하곤 했는데 이 대만의 전시장에서도 번호판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스스로를 웃겨하면서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에 제가 봤던 그의 영화가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뿐이었기 때문일까요? 한 벽면을 채운 밍의 얼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관을 보고도 계속 그 얼굴이 마음에 남아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한참을 서있었어요. 그때 쓴 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술이 뭔지 모르거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길래 이렇게..;;’라는 생각도 하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 하는 것도 많고..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걸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분석을 누군가는 하긴 하던데 그 분석에 다 공감 못 할 때도 많고 사실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거덩.
근데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작품을 봤던 그 시기가 좋아서 기억할 때가 있잖슴
고령가..는 그래서 기억에 남을 듯
비 오는 버스 안에서 보던 거
밍의 시선 뭐 이런 거
이렇게 짧은 일기를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 문득 왜 내가 <애프터양>을 그렇게 좋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영화가 어떤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기억 조각조각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남들도 그런 조각들로 이뤄져 있고, 그 조각들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조각을 들여다보면 존재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조각을 가장 빠르게 대면하는 방법이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을 보면서 밍과 시선을 마주하게 된 거죠. 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까지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눈을 마주쳤고, 밍의 조각을 마주하게 돼 어느순간 밍이라는 인물을 조금은 사랑하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 그리고 둘>은 보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에드워드 양의 영화 한 편을 더 봐야겠다 하고 튼 영화가 <해탄적일천> 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시 순식간에 다 보고 말았어요. 이 영화도 166분, 2시간 46분으로 상영 시간이 짧지 않은데 홀린 듯 또 순식간에 보고 말았어요.
에드워드 양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부재하는 스펙타클 속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이 영화 속에선 스펙타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블 같은 폭발적인 서사적 충돌이나 자본적 충돌은 없단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져요. 독백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서사는 스펙타클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이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거대한 스펙타클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결말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계속 좇아가게 됩니다. 왜일까? |